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이건 장례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국내 대표 상조기업 B사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했던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그의 고백은 B사 내부의 구조적 문제, 실무자 인권침해, 소비자 기만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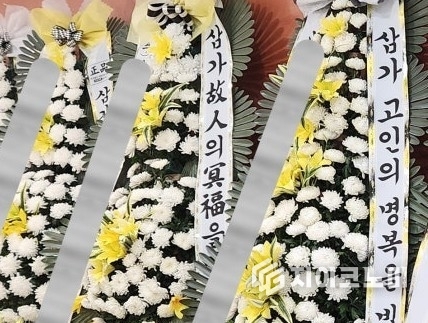
A씨는 B사의 장례식장에서 이뤄지는 추가 상품 강매 구조와 부당 이득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회사는 법무팀을 통해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통보했고, 해고를 시사했다. “더 이상의 유가족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을 결심했지만, 회사는 이를 곧 ‘추방’으로 응답했습니다.”(장례지도사 A씨)
B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은 수의, 유골함, 고깔, 리무진, 관 등 장례에 필요한 기본 품목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장례 현장에서는 실무자들이 “기본형은 질이 낮다”, “고인을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식의 판매 멘트를 강요받고 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은 가입 당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장례 당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추가하지 않으면 고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할 것처럼 말할 때, 제 양심이 무너집니다.”(B사 장례지도사 A씨)
실무자들은 본래 고인을 예우하고 유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역할을 맡지만, B사 내부에서는 이들이 실적을 채우는 판매 인력으로 전락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장례식장 자체 이용이 일반화되며 상조 상품 이용률이 낮은 현실도 무시된다. 그럼에도 B사는 490만 원 이상의 고가 상품을 구매한 유족에게조차 추가 판매를 지시하고 있다.
B사 실무자들은 사망 통보 후 즉시 출동하는 24시간 비상 대기 체제에 놓여 있으며, 장시간 노동과 밤샘 업무, 과도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일을 합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업셀링’ 기회로 삼는 구조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B사 장례지도사 A씨)
이는 “윤리 기준 마련과 제도 개입 시급”한 사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조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실무자 감정노동 보호 장치 마련 △공정한 상품 안내 기준 법제화 △내부 고발자 보호 체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의 직권 조사 실시 등이다.
“상조 서비스는 본래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의의 제도였지만, 지금은 일부 대형 기업의 손에서 고통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사 사례는 단일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한다. 이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개입, 실무자와 유가족 모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감시가 시급하다고 본다.













